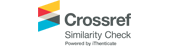서 론
정밀사양, 정밀축산, 스마트축산이란 용어는 이제 축산 분야에서 매우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마치 이들 용어를 제외하고는 축산 연구를 기획할 수 없는 것처럼, 이들이 우리 축산의 미래인 것처럼 각종 보고서, 과제요청서, 연구 과제명에서 이들은 매우 빈번하게 등장한다. 특히 축우(cattle) 분야에서 정밀축산과 스마트 축산 관련 연구 논문의 발표 건수는 2015년 이후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에서 ‘precision feeding cattle’ 또는 ‘smart farming cattle’이라는 검색어로 SCI(E) 저널에 발표된 논문을 검색하면, 2015년 7편에 불과하던 논문수가 2018년 44편, 2021년 106편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16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2024년 3월 26일 기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축산인들은 이들 용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지 모른다. 다수의 사람들이 “정밀하게 동물을 사양하는 것”, “정밀하게 동물을 생산하는 것”, “똑똑하게 축산을 하는 것” 등 동어반복을 할 뿐 이들을 ‘정밀하게’ 정의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의 사람들은 세 용어 중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유행했던 정밀사양에 대해 이미 철 지난 개념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본 고에서는 정밀사양, 정밀축산, 스마트축산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과연 이들이 우리 축산의 미래의 모습이 맞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서 본 고의 목적이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 또는 연구 결과를 정리한다거나 그 기술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특히 축우용 생체 센서의 종류 및 효과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에서 제시한 바 있다[1]. 본 고에서는 우선 현재 우리 축산의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를 도출한 후에 정밀사양, 정밀축산, 스마트축산이 무엇인지, 이것들이 우리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를 알아보고, 시대의 흐름 속에 이들의 필요성이 확보되는 지를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 후에 이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한국 축산업의 필요성과 당면과제
앨버트 아인슈타인은 “나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시간이 주어진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생각하는데 55분의 시간을 쓰고, 해결책을 찾는데 나머지 5분을 쓸 것이다”라고 하였다. 축우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연구를 수행하고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선 무엇보다 축우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특히 분야의 특성상 연구 개발에 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어야 하므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전에 그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지 않을까? 다시 말해 축산의, 축우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게 타당한지, 그것의 적절성과 필요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어쩌다 보니 축산인’이 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단적 이기심의 발로로 축산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객관적이고 메타적인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축산 연구의 필요성을 산업 · 경제적 측면, 문화 · 사회적 측면, 생물학적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산업 · 경제적 측면에서 축산업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22년 현재 축산업의 생산액은 25조 원으로 생산액 기준으로 농업 전체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달한다[2]. 특히 농업에서 차지하는 축산업의 비중은 1993부터 매년 평균 0.74%p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추세라면 2031년에 농업 생산액의 절반이 축산업으로부터 기인하게 된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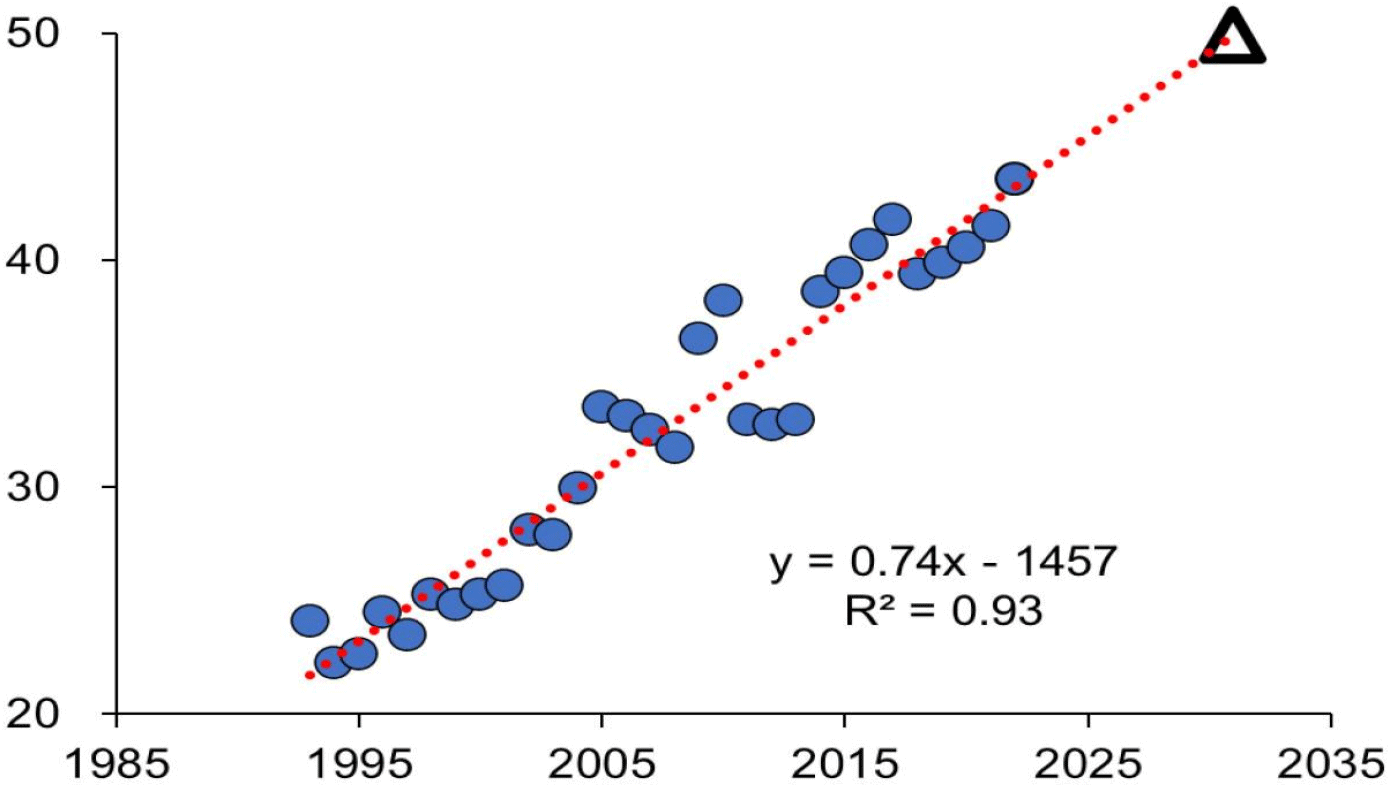
먹거리 산업에서의 축산의 중요성은 품목별 국민 1인당 소비량을 살펴보면 더욱 드러난다. 2022년 기준 우유는 국민 1인당 85.7 kg으로 쌀을 제치고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농산물이었다. 더욱이 축산물은 모두 1인당 소비량이 제일 많은 상위 10개 품목에 포함되어, 돼지고기(30.1 kg)는 5위, 계란(16.7 kg–278개 60 g/개 기준), 쇠고기(14.9 kg), 닭고기(14.8 kg)이 각각 8, 9, 10위를 차지하였다[2]. 따라서 한국인의 주식은 축산물이라 할 정도로 축산물의 소비량은 많으며 산업 · 경제적 측면에서 축산업은 매우 중요한 먹거리 산업이며, 지금까지의 데이터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추론하면 축산업의 중요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 · 사회적 측면에서도 국내 축산업의 중요성은 두드러진다. “스포츠 경기에는 치맥”이라 하며, 축구 경기가 있는 날에 치킨업계 매출이 50% 이상 증가할 정도로 스포츠 관람과 함께 닭고기를 소비하는 것은 한국인의 문화 속에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3]. 여름 휴가철 바베큐 등으로 육류소비량은 급증을 하며, 명절에 한우 세트를 선물하거나 한우 고기를 대접하는 것은 상대를 특별하게 여긴다는 표현이 된다. 이렇게 육류를 소비하는 것이 경제 성장과 함께 서구의 육식 문화가 국내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이다. 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는 이미 오래 전에 우리 한국인의 생활 속에 고착된 것으로,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18세기 조선은 연간 40만 마리의 소를 도축하였고 숯불 구이 방식으로 소고기를 즐겼다고 한다[4]. 다시 말해 한국인이 고기를 귀하게 여기고 즐기는 것은 우리의 오랜 문화적 전통이다.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국내 축산물의 소비는 일정 수준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안정적인 축산물의 공급이 요구된다. 특히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살충제 계란, 광우병 파동 등에서 나타나 바와 같이 국내 소비자들은 축산물의 안전성에 매우 민감하다. 현재 국내 육류의 자급률은 약 64%, 우유의 자급률은 약 44%이다[2]. 지난 Covid19 사태를 겪으며 국가별 식량 보호주의가 발동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게 된 상황에서, 축산업계는 안전한 국내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채식주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잡식 동물 (omnivore)이며 초식동물(herbivore)보다는 육식동물(carnivore)에 가깝다. 이것은 소화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데, 소화기관, 즉 위장관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면 그 동물이 어떤 음식을 주로 먹는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 지를 알 수 있다. 초식동물의 위장관은 섬유소를 분해 · 이용하기 위해 위장관이 특별히 발달되어 있다. Fig. 2는 포유동물의 소화기관의 구조와 길이를 보여주는데[5], 예를 들어 초식동물인 반추동물은 구조와 기능이 다른 4개의 위를 갖고 반추(되새김) 작용을 하고 긴 소장을 통해 섬유소 이용률을 극대화한다(Fig. 2a-좌). 또는 대장의 일부(맹장 또는 결장)가 발달하여 장내 미생물에 의한 발효가 활발히 일어난다(Fig. 2a-우). 이와는 달리 소화율이 높은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육식동물의 경우 매끈한 위와 주름이 없고 길지 않은 장을 가지고 있다(Fig. 2c). 그럼 사람의 경우에는 어떨까? 사람의 위는 매끈하고, 맹장은 부록(appendix)이라 불릴 정도로 퇴화되어 있고, 결정은 주름이 많지 않고 발달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사람의 위장관은 육식동물의 위장관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며 섬유소를 잘 소화시킬 수 없고 초식보다는 육식을 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기능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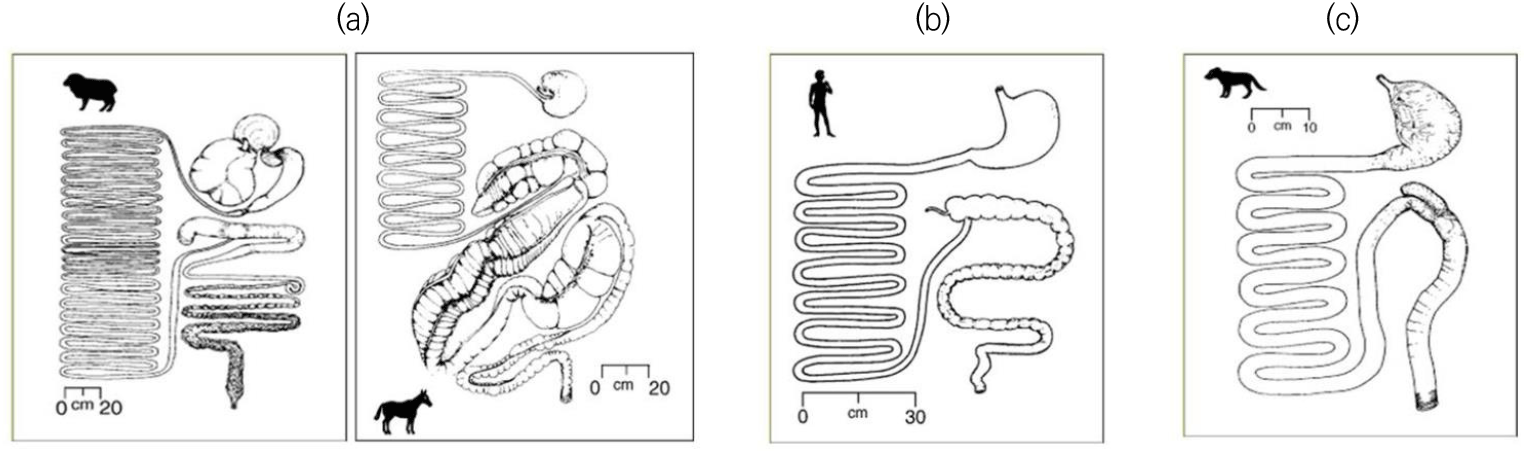
이렇듯 축산물의 섭취는 생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당연한 일이며 이념이나 생각의 체계와는 달리 과학적으로 정당성을 갖는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축산업은 문화 · 사회적 측면과 산업 ·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축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이에 따라 축산 연구에 대한 투자는 당위성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축산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고기 없는 햄버거, 배양육, 우유 없는 유제품 등의 등장이다. 이들은 축산물은 먹고 싶은데 축산은 회피하고 싶기 때문에 나온 대체물들이다. 심지어 축산 연구자들 중에서도 배양육과 같은 대체물이 축산물이고 따라서 축산 연구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물론 배양육 연구도 필요한 연구 분야이고 축산에서도 이를 연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에서 연구의 선후와 경중을 따진다고 할 때, 배양육이 다른 연구에 비해 중요도나 우선 순위가 높을 수는 없다. 이것은 하나의 사고실험을 통해 논리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고기를 배양육이 100% 대체한다고 가정한다면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가축 생산, 즉 축산을 할 필요가 있는가? 배양육과 축산은 서로 모순(矛盾)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축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양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즉 축산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이유로 동물을 도축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다. 축산물을 아예 먹지 않는 완전 채식주의자들은 동물과 인간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동물을 도축하는 행위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일임을 주장하고 동물권 존중과 동물 해방을 부르짖는다[6]. 이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집중사양 방식으로 생산된 축산물은 먹지 않겠다는 환경적 채식주의자들은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육식 자체보다는 가축이 사육되고 도살되는 조건에 주목한다. 현재 축산업의 관행이 동물의 복지와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동물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에서 가축이 사육되어야 하며, 이런 조건이 충족되는 한 축산물의 섭취가 허용될 수 있다는 철학적 담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7,8].
두번째 이유는 축산업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는 믿음에서 기인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18%는 축산에서 기인하며, 축우 부문은 4.6 기가 톤 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축산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65%를 차지한다[9]. 특히 소가 반추위의 발효 과정에서 배출하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8–34배의 온실 효과를 갖고 있으며[10], 축산 분야 온실가스의 약 40%를 차지한다[11].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축산업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를 넘지 못한다[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 · 기후의 여러 이상 징후를 경험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내 아이에게 살기 좋은 지구를 전해주기 위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포함한 환경 오염원의 배출량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은 축산 분야 전체의 당면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축산업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생산비 절감을 통해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최근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국내산 대신 수입산 축산물 및 축산물 유래식품을 사용하는 주요 이유로 가격을 들고 있는데, 육류의 경우 평균 71%, 우유 및 유가공품의 경우 51%가 “국내산은 원가가 높아 가격경쟁이 안돼서” 수입산을 사용한다고 대답했다[13]. 특히 우유의 경우 1리터 당 생산비가 2001년 446원에서 2022년 959원으로 115%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원유 평균 가격은 629원에서 1,116원으로 77.4% 증가하였다[14]. 이러한 가격 증가로 인해 우유 소비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수요를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으로 충족하는 실정이다. 또한 우유와 달리 경매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한우의 경우, 한우 비육우 두당 생산비는 꾸준히 상승하여 2018년 8,406천 원에서 2022년 10,337천 원으로 23% 상승하였으나, 같은 기간 두당 소득은 1,088천 원에서 506천 원으로 반 토막이 되어, 수익성 확보가 한우 농가의 커다란 과제가 되었다[15]. 소비자 가격은 생산비와 유통 · 판매비로 나뉘어지는데, 유통 · 판매비도 중요하지만—어찌 보면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게 더 필요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무엇보다 생산비를 낮추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980년 이래로 한우 비육우 생산비는 매년 22천 원/100 kg, 우유 생산비는 매년 15원/kg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생산비 중 사료비는 2022년 기준 60%에 육박하고 있다[2].
요컨대 축산과 축우 산업의 당면 과제는 축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일이다. 축산물 소비자의 요구는 우선 동물복지가 보장되는 환경에서 가축이 사육되도록 사양 조건을 개선하고, 환경 오염원의 배출을 최소화하여 축산물을 섭취하는 데 있어 죄의식을 갖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고품질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두 마리, 아니 세 마리 토끼를 잡기를 원한다. 소비자들이 이런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생산성은 유지 또는 증대하되, 동물에게 공급하는 사료량을 줄여 사료비를 절감하고 잉여의 영양소가 환경으로 배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동물을 사양하는 것이 다음에 이야기 할 정밀사양이다.
정밀사양
정밀사양(precision feeding)이란 동물의 요구량에 맞추어 영양소를 과부족 없이 정밀하게 공급하여 사료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 오염원의 배출을 최소화 하는 사양 기술을 말한다[16]. 학문 영역에서 정밀사양이란 용어는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정밀사양의 기원을 알아보기 위해 구글 학술검색을 실행하면, 제일 먼저 그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검색되는 논문은 Butler[17]의 “The permanent gastrostomy: a modern revised feeding technique involving the precision diet”이다. 그는 “through precision feeding we can keep a dying patient in a healthy state of nutrition”이라고 주장하며, 생리적(영양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조하여 공급하는 음식 또는 식단을 ‘precision diet’라 명명하고 precision diet를 공급하는 과정을 정밀사양이라 하였다. 비록 주목적이 건강 유지였으나,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한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정밀사양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축산분야에서 제일 먼저 정밀사양을 언급한 것으로 검색된 논문은 1975년에 발표된 Broster[18]의 “Principles and practice in level of feeding for the dairy cow”이다. Broster[18]은 비록 정밀사양을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The advantages of reducing labour costs need to be set against the advantages of precision feeding”이라고 언급하며 젖소 개체별 영양소 요구량에 따라 사료 공급량을 달리하는 사양이 정밀사양임을 암시하였다. 논문의 제목에 정밀사양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등장시킨 연구 발표는 Sibbald[19] 의 “Bioassays based on precision feeding of poultry”로 보인다. 그러나 이때의 정밀사양은 true metabolizable energy 등을 측정하기 위해 일정한 양의 사료를 정해진 시간(예를 들어 절식 후 24시간 후)에 조류의 소낭에 투여하는 실험 방법을 말하므로 일반적인 정밀사양과는 다르다.
현대적 의미의 정밀사양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등장한다. 특히 1997년부터 미국에서 밀집축산시설(confined livestock operations, CAFO)의 암모니아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고, 밀집축산시설은 수질 오염과 공중 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괄적 영양소 관리 계획(comprehensive nutrient management plans, CNMP)을 수립‧실행해야 한다는 규제가 발동됨에 따라 분뇨를 통해 배출되는 영양소를 최소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20]. 이에 따라 정밀사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이런 관점에서 Cole[21]은 정밀사양을 동물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환경으로의 영양소 배출을 최소한으로 하는 방식으로 가축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즉, 동물이 요구하는 만큼만 영양소를 급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왜 이러한 사양 방식을 정확사양(accurate 또는 accuracy feeding)이라고 하지 않고 정밀사양(precision feeding)이라고 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다. 정확도(accuracy)는 예측치가 실측치를 차이 없이 얼마나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낸다. 반면 정밀도(precision)은 반복적인 예측을 할 때, 예측치 간에 얼마나 차이가 적은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동물의 요구량에 따라 영양소를 정확히 공급해야 하므로 정확사양이 맞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다. 또한, 정밀사양이라고 할 때, 이를 precision feeding이 아니라 precise feeding이라고 해야 언어적으로 더 적절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한 대답은 Danny G. Fox 교수가 중심이 되어 정밀사양을 실현하는 방법론과 정밀사양의 효과에 대해 가장 많은 연구를 수행한 미국 코넬대(Cornell University) 연구자들의 정밀사양에 대한 정의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정밀사양의 목표는 동물의 요구사항과 사료의 영양적 가치를 정확히 예측하여, 동물에게 급여하는 사료를 더 적은 안전 여유(safety margin)로 제조할 수 있게 하고 생산량 저감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라 하였다[20]. 그리고 정밀사양은 작성한 배합비와 동일하게 제조된 사료를 동물이 섭취하도록 하는 관리 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동물의 건강, 안락함, 그리고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목표하는 축산물의 생산, 품질 및 동물의 경제수명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코넬 연구자들의 말에 따르면 정밀사양은 동물의 영양소 요구량에 맞게 정확한 양의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목표한 양을 정밀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정확한 양을 정밀하게 공급하는, 정확한 사양(accurate feeding)을 정밀하게(precisely)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양(accurate feeding) 또는 정밀한 사양(precise feeding)이 아니라 정밀사양(precision feeding)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밀사양은 동물의 영양소 요구량에 맞춘 영양소 공급량의 정확한 예측은 기본으로 하고, 이런 영양소 공급을 정밀하게 관리하는 기술 및 목표 설정을 의미한다.
낙농을 대상으로 하는 코넬대 연구자들과 달리 양돈에서 정밀사양의 실현에 애를 쓴 캐나다의 Pomar 박사는 정밀사양을 동물 간의 변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무리 안의 개체에게 적절한 시간에 필요한 영양소가 적절히 배합된 사료를 적절한 양만큼 제공하는 사양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정밀사양은 영양소의 이용성을 개선하고 사료 비용과 영양소 배출을 줄이는 필수적인 방법이라 주장하였다[22]. 즉, 최소의 비용과 최소의 환경오염원 배출을 이루기 위해 동물 개체마다 서로 다른 필요한 만큼의 영양소를 공급하는 기술로 정밀사양을 정의하였다.
종합하면, 정밀사양을 적용하는 것은 한마디로 동물에게 급여하는 영양소 공급량의 안전여유를 최소화 한다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요구량은 예상평균요구량(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EAR)이다[23]. 이것은 특정 품종, 성별, 생리단계의 건강한 개체들 중의 절반의 개체의 요구량을 충족시키는 수준의 영양소 섭취량을 말한다[24]. 다시 말해 EAR에 따라 영양소를 공급하면 우군의 절반에 해당하는 개체는 요구량에 비해 적은 양의 영양소를 섭취하게 된다. 부족한 영양소의 섭취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소득 감소는 추가의 사료를 공급하는 비용에 비해 치명적이다. 따라서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개체가 적도록 EAR보다 더 많은 양의 영양소를 공급하기 마련인데, 거의 모든 개체(97.5%)의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만큼으로 설정된 영양소 공급량이 영양소권장량(recommended dietary allowance, RDA)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EAR의 1.2(1 + 2 × 변이계수/100)배가 된다. 만약 RDA를 기준으로 가축에게 급여하는 영양소 공급량을 설정한다면 거의 모든 개체의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는 있으나 일부의 개체에게는 너무 많은 양의 영양소가 공급되게 되며, 이런 잉여의 영양소 공급량은 사료비 상승뿐만 아니라 동물의 과비로 인한 대사성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이런 잉여의 영양소 공급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기술이 정밀사양이다. 그러므로 정밀사양은 오래된 식상한 개념이 아니라 축산이 추구해야 할 사양 관리 목표라 할 수 있다.
정밀사양을 현장에 적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과히 극적이다. 미국 뉴욕 주의 낙농 목장에서 5년간 정밀사양을 적용한 결과 사료 구입 비용은 24.2% 감소하고, 유생산량은 45.4% 증가하였으며, 질소와 인의 배출량은 각각 17.1%와 28.2% 감소하였다[20]. 비록 해당 연구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화를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결과를 바탕으로 유추하면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감소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요컨대 생산량을 증가하면서도 사료비를 줄이고 환경오염원의 배출을 줄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은 것이다.
동일한 효과를 국내에서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밀사양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우선 세밀한 사료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내 사료검정인증기관에서의 분석 항목은 수분, 조단백질(crude protein, CP),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등의 일반 성분과 중성세제섬유소(neutral detergent fiber, NDF), 산성세제섬유소(acid detergent fiber, ADF) 및 칼슘과 인 정도인데[25], 이 정도의 분석으로는 반추동물사료의 영양적 가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일례로 미국 축우사양표준은 위 항목들 이외에도 탄수화물에서는 수용성탄수화물, 전분, 리그닌 등, 단백질에서는 용해단백질, 중성세제불용단백질(neutral detergent insoluble protein, NDICP), 산성세제불용단백질(acid detergent insoluble protein, ADICP), 단백질 A, B, C 분획과 B분획의 소화 속도 상수, 필수아미노산, 지방에서는 총지방산과 C12:0, C14:0, C16:0, C16:1, C18:0, C18:1 trans, C18:1 cis, C18:2, C18:3 지방산 함량을 기본적으로 요구한다[23,26]. 설사 필수아미노산과 지방산의 함량은 매번 분석하지 않고 성분표의 수치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외의 탄수화물과 단백질 부분의 분석 결과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영양적 변이가 큰 조사료는 물론이고, 농후사료의 경우에도 구입 시기에 따라 영양소 변이가 크기 때문에[27] 정기적인 분석을 실시해야 하며, 시료 채취에 따른 분석 결과의 오차도 크기 때문에 주의해서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28].
지속적인 사료 분석과 함께 정밀한 배합을 통해 실제로 동물에게 공급되는 영양소 함량이 배합비와 동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Sova et al.[29]의 연구에 따르면, 22개 목장에서 배합된 TMR(total mixed ration, 섬유질배합사료)이 배합비와 실제 동물에게 공급되는 영양소 간의 차이(accuracy)가 평균적으로 CP +0.4%p, NDF +0.55%p, 가소화영양소총량(TDN) −2.7%p, 비유정미에너지(NEl) +0.05 Mcal/kg였다. 변이계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무기질이 6.1%–52.4%로 변이가 컸고, CP는 3.5%, NDF는 6.5%, NEl은 2.6%였다. 같은 목장 내에서 매일 매일의 변이(precision)는 정확도보다 적었다. 이때 은 이러한 변이가 낙농 목장의 우유생산량의 변이에 주목하였는데, NEl의 변이가 큰 목장일수록 두당 우유생산량이 적어진다는 관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Fi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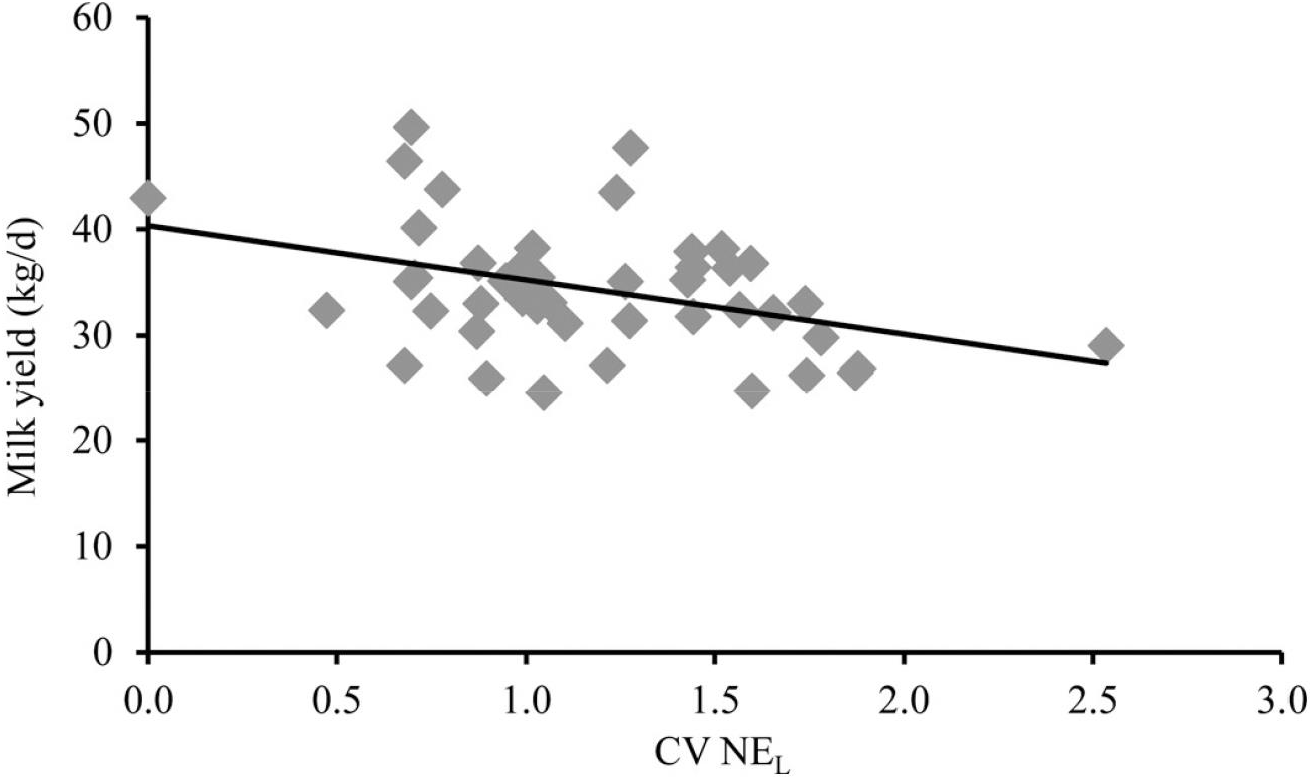
정밀사양의 현장 적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체 간 영양소 요구량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정밀하게 사료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나는 개체 별 차이, 즉 개체 별 영양소 요구량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해당 개체에게 정밀한 양의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 즉 개체 맞춤형 사료 공급이다. 요컨대 정밀사양을 위해서는 개체 맞춤형 사양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관행 사양에서는 개별적으로 사료를 공급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실시하지 않는다. 그나마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동물 그룹으로 우군을 분리하여 우군 별로 영양소 공급량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나라 낙농가처럼 사육규모가 적은 목장에서는 실시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쓰는 방법은 안전여유를 늘리는 것 뿐이다.
안전여유의 개념과 적용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같은 생리 단계의 유사한 체중을 가진 동물이라 하더라도 개체 간 영양소 요구량의 변이는 10% 가량이다[24]. 여기에 원료 사료의 영양소 변이 10%, 배합비와 실제 동물이 섭취하는 영양소 변이 5%만 고려해도 변이계수는 15%가 된다. 변이계수가 15%일 때, 만약 우군 내 거의 모든 개체(98%)가 요구량을 충족하도록 영양소를 공급하려면 권장량(RDA)을 공급해야 하고, 이는 평균요구량(EAR)에 30(2×변이계수)%를 더한 값이다. 이 경우 다수의 개체가 너무 과하게 영양소를 섭취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수준을 낮추어 우군 내 84%의 개체가 요구량이 충족되도록 목표를 변경한다면 공급량은 평균요구량(EAR)에 15%를 더한 값이 되며, 이것이 안전여유이다. 다시 말해, 한우 거세우를 키울 때 육질 1++ 등급의 출현률을 84% 얻고 싶다면 1++ 출현을 위해 공급해야 영양소를 기준으로 안전여유를 고려해 영양소를 최소 15%를 더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여유가 더 커지게 된다. 우선 위의 사료 영양소 변이 계산에서 시료 채취, 분석 오차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만일 사일리지 등 습식 사료를 급여하는 경우 변이가 더 증가한다. 또한 동물이 생리 단계와 체중이 유사하다고 가정하여 동물의 변이를 10%로 계산하였는데, 만일 비슷한 월령으로 우군을 분리할 수 없어 우군 내 월령이 3–4개월 차이가 난다고 하면 우군 내 체중 변이만 10%가량 될 것이며 따라서 동물 변이는 18%로 증가한다. 여기에 TMR을 급여하는 경우 사료 건물 변이를 더하며 총 안전여유는 20% 가량된다.
결론적으로 동물의 영양소 요구량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사료의 영양소 함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개체별 요구량에 따라 사료를 급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생산성 유지를 위해서는 안전여유를 늘리는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영양소 공급량 즉 사료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안전여유를 줄이는 것이 정밀사양의 핵심인데, 목표하는 생산성을 얻도록 하는 정밀한 사료를 배합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기고문에서 이야기한 바 있다[30]. 정밀사양을 위해 동물의 영양소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개체별 요구량에 따라 사료를 급여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이후에 소개하는 정밀축산과 스마트축산이다.
정밀축산과 스마트축산
정밀축산(precision livestock farming, PLF)은 가능한 한 가장 작은 생산단위를 관리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또는 센서를 이용해 개체별 관리를 실시하는 기술을 말하며[31], 축종에 따라 정밀낙농, 정밀양돈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밀축산은 개체(또는 소규모 군집)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찰하여 개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 · 생리적 요구를 파악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발전으로 기능해졌으며, 센서와 ICT 장비를 활용하여 개체에 대한 다양하고 세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동물의 생리와 상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센서 및 장비는 1) 동물에게 부착하거나 삽입하는 착용 센서(at animal), 2) 영상 장비, 섭취량 측정기, 체중계 등 주변에서 동물을 관찰하는 형태(near animal), 3) 호흡으로 배출되는 가스나 우유 등 동물로부터 획득한 시료를 통해 동물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from animal)로 구분할 수 있다[32]. 이런 장비와의 원격 통신을 통해 동물에 대한 데이터 획득이 용이해지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번식, 생산성, 질병 등 개체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사양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31].
정밀축산은 양돈, 양계 등 여러 축종에서 개발과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33,34], 그 발전과 확산의 정도는 특히 낙농분야에서 두드러진다[35]. 전 세계에 60종 이상의 축우용 착용 센서가 판매되고 있으며 대부분 젖소에 활용된다[1].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연구적으로 개발된 센서가 아니라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센서가 60종 이상이다. 이 중에는 이표형, 굴레형, 목걸이형, 반추위 삽입형, 발찌형, 꼬리/미근 장착형, 질 삽입형이 포함되며, 이들은 섭식 패턴(섭식, 반추, 음수), 행동 패턴(격한 활동, 보행, 기립, 휴식), 체온, 반추위 온도 및 pH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더욱이 로봇착유기의 보급은 2010년 이후 급격히 확대되어 일부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보급률이 30%를 상회한다[36]. 로봇착유기는 개체별 배합사료 섭취량, 착유 횟수, 산유량을 알려 주고, 분방 별 젖내림 시간, 유속, 유성분 등 다양한 비유 특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비디오 분석을 통해 개체 인식, 체중 및 BCS(body condition score, 체충실지수) 측정, 파행 진단, 사료 섭취량 측정 등이 가능해지고 있다[31]. 이런 다양한 센서를 활용해 개체의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이를바탕으로 동물의 니즈를 파악하는 정밀축산 기술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축산은 정밀축산에 자동화(automation)을 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스마트축산의 스마트(SMART)는 원래 ‘Self-Monitoring, Analysis, and Reporting Technology’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37]. 관찰, 분석, 보고를 스스로 하는 기술, 즉 자동화 기술이 스마트 기술이다. 스마트 기술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 지능, 로봇 기술의 발달과 함께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스마트축산에서는 인식, 분석, 보고를 스스로 하는 스마트 기기에 의해 농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작업들이 이루어진다.
스마트 기기는 다양한 센서, 통신 기능,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탑재하여 자동화와원거리 제어가 가능하다. 스마트축산에서는 이러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 1) 감지 및 모니터링, 2) 데이터 분석 및 판단, 3) 원격 제어 및 조정의 세 가지 주요 과정을 수행한다(Fig.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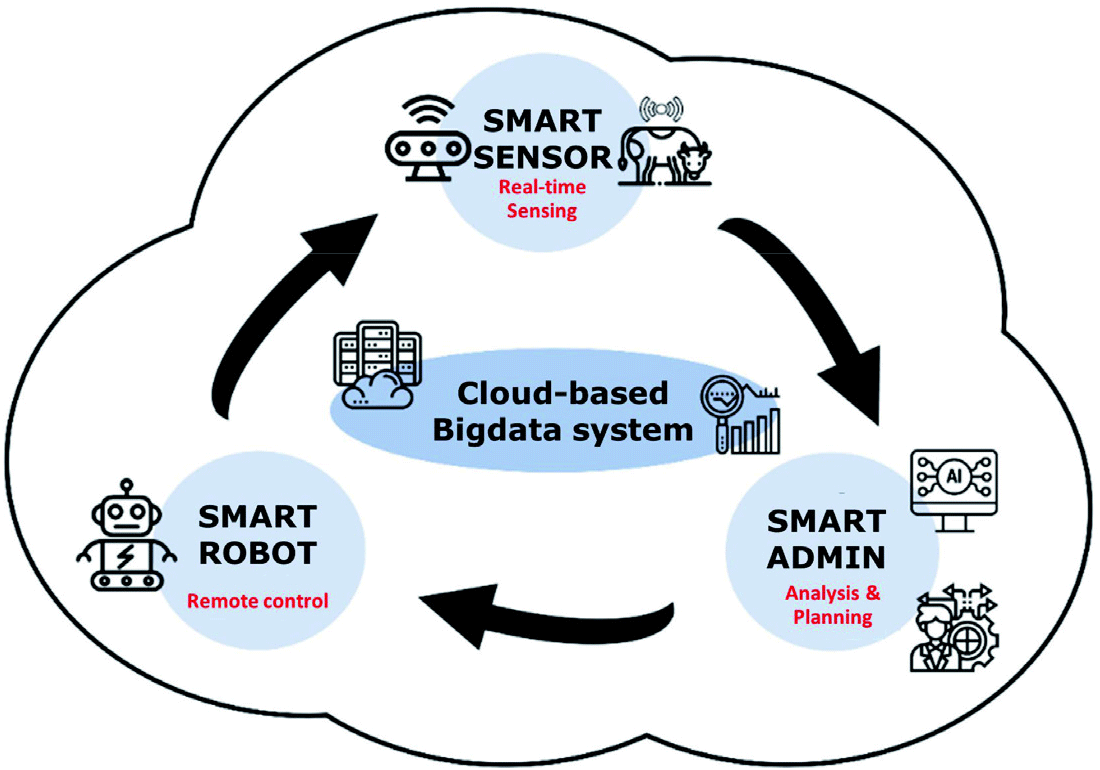
예를 들어, 축사 내 온도 센서는 주위 온도를 측정한 후 중앙 관리 시스템에 테이터를 전송한다. 중앙 관리 시스템의 인공지능은 현재 온도가 적정 범위 내에 있는지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팬 제어 시스템에 신호를 보내 팬을 작동시킨다. 이 일련의 과정은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또 다른 예로, 비정상적인 개체이 있을 경우 센서가 이를 감지하여 중앙 관리 시스템에 보고하고, 인공지능이 해당 개체의 상태를 분석 및 진단한 후, 필요시 목장 관리자나 수의사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일련의 과정이 스마트하게 이루어진다. 기술이 더 발전하면, 로봇이 해당 개체에 대해 직접 처치를 수행하는 등 자동화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스마트축산의 궁극적 목표는 관리자에게는 목표 설정과 전략적 계획 수립과 같은 고차원적 역할만을 요구하고, 실제 목장 운영 과정은 대부분 자동화된 시스템과 기계에 의해 수행됨으로써 최소한의 노동력으로 많은 수의 동물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스마트축산의 기술 단계는 편의성 향상을 목표로 원격 제어 시설을 개발 및 보급하는 1세대, 생산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데이터 기반 정밀 생육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2세대, 로봇에 의한 전주기 자동화를 목표로 하는 3세대로 나뉜다[38]. 현재 국내외 적으로 스마트축산은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축산 시대
스마트축산의 시대가 도래하리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현대 사회는 흔히 스마트폰의 시대라 불리며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사람들은 항상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다닌다. 15년 전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다. 우리는 스마트폰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편리함 또는 단순히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예를 보더라도 모든 축산업자가 스마트축산 기술을 도입하지는 않겠지만, 스마트축산의 시대는 결국 도래할 가능성이 크며 여기에는 추진력과 견인력이 모두 작용한다[39].
무엇보다 강력한 추진력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제공한다. 무선데이터 통신,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 로봇 및 자동화, 클라우드 컴퓨팅, AI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들이 우리를 스마트축산의 시대로 힘껏 밀고 있다. 현대 사회는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느끼게 하는 분위기마저 조성하고 있다. 공학자들은 과거 닷컴 붐 시기처럼 다양한 기술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주요 국정 전략에 포함하여 스마트 농업을 핵심 선도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재단법인 스마트팜 연구개발사업단’을 출범하고 2027년까지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에 약 4,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40].
추진력이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견인력도 존재한다. 이는 스마트축산의 필요성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지속가능성은 한 산업이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의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런 당면 과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서술한 바 있다. 스마트축산의 도입을 통해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35], 본 장에서는 스마트축산의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스마트축산은 동물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동물복지는 동물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된다[41].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시행 2021.2.12., 법률 제16977호] 제3조는 동물 사육 시 갈증, 굶주림, 고통, 상해, 질병, 스트레스 등의 문제를 방지하여 동물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동물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물의 부족한 상태를 신속히 발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축산업이 산업화되고 대규모화 되면서, 사육하는 동물의 수가 증가하여 개체별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특히, 동물의 생리적 상태나 건강을 육안으로 판단하는 일은 상당한 경험이 없으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센서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동물의 생리, 건강, 생산성을 인지하여 그에 걸맞은 사양 관리를 제안하는 스마트축산 기술은 동물의 요구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 이로써 개체단위의 동물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축산은 동물의 환경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는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세계 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는 2023년이 174년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고, 33%의 확률로 2024년이 지구의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섭씨 1.5도 이상 상승한 첫 해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42]. 우리나라의 경우, 대관령과 같은 추운 지역은 겨울철 한파가 더욱 심해지고, 대구와 같은 더운 지역은 여름철 폭염이 극심해지는 등 기후 변화로 인해 특정 계절에 동물의 건강과 생산성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43]. 스마트축산은 환경 제어를 통해 동물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축사 내 온도가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센서가 이를 감지하고, 중앙 관리 시스템의 지시에 따라 온도를 조절하는 제어 시스템은 이미 개발되어 상용화되고 있다[44].
또한 스마트축산 기술은 동물 사육 시 메탄가스를 비롯한 환경 유해 물질 배출을 줄여 기후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스마트축산 기술을 통해 정밀사양 관리가 가능해진다. 센서 기술을 통해 동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에 맞춰 영양소를 정밀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은 양돈[45], 양계[46]에서도 연구되고 있고, 특히 젖소에서는 정밀낙농 기술을 활용해 동물복지를 증진하는 동시에 메탄가스, 질소, 인 배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47]. 스마트축산 기술은 사료 영양소의 이용효율을 높여 환경으로 배출되는 영양소를 줄이는 정밀사양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동물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켜 생산성 증대라는 간접적 시너지 효과도 가져온다[35].
스마트축산은 농가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마트축산 기술은 축사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 시간을 단축하며 작업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농가의 삶의 수준을 한층 높여준다. 유럽의 연구에 따르면 로봇 기술의 도입은 착유에 소요되는 노동 시간을 약 30% 단축하고, 사료 급여에 소요되는 시간은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었다[48]. 무엇보다도 로봇기술을 도입한 낙농가들은 작업 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하고, 자신의 리듬에 맞춰 일정을 계획할 수 있다는 점을 스마트축산의 큰 장점으로 평가한다[49].
스마트축산을 통한 노동 환경의 개선은 축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인력난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에 주요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고령화 문제 또한 심각하다. 2023년 낙농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낙농 경영인 중 60대가 4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70대 이상도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0]. 이는 2011년에 비해 고령화가 크게 심화된 결과로, 당시에는 50대가 56.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60대는 16.6%, 70대는 거의 없었다. 낙농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낮은 보수와 부채 증가 등 금전 문제(46.9%), 휴일 부족 등 고된 노동(26.2%), 수입개방, 안티축산으로 인한 장래성 불투명(25.9%) 순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스마트축산 기술은 시간과 노동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젊은 후계자를 비롯한 인력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마트축산 기술의 도입은 농가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동 시간이 줄어들어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발정, 수정 시기 및 출산 탐지와 같은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다. 또한, 최첨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자부심은 농가의 정신적 만족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밀축산 기술의 도입과 관련된 통계는 낙농 분야에서 2018년에 실시한 설문이 유일하다(이민경과 서성원, 2022)[51]. 국내 낙농가의 46%가 응한 이 설문에 따르면, 로봇착유기를 도입한 농가는 1.8%에 불과했고, 낙농가의 약 24%가 유량계를 도입하여 개체별 산유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착용형 무선 생체 센서는 약 20% 농가에서 발정 탐지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예상해 본다면 국내 정밀축산 및 스마트축산 기술의 국내 도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이탈리아에서 실시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조사한 농가 중 로봇착유기를 도입한 농가 19%를 포함하여 73%의 농가가 개체별 산유량을 파악하고 있었고, 78%의 농가가 활동량 측정을 통해 발정을 탐지하는 착용형 무선 생체 센서를 이용하고 있었다[52].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해 스마트축산 기술을 도입하고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53], 우리나라도 이와 마찬가지로 스마트축산의 시대가 도래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것처럼 보인다.
스마트축산의 한계
스마트축산은 아직 어두운 면도 가지고 있다. 우선, 스마트축산의 도입은 경제적일까? 양축 농가가 스마트축산 기술을 도입하는데 있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비용인 것으로 조사된다[52,54]. 스마트축산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센서, 로봇, 기타 설비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상당한 초기 투자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비용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며, 기술 도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특히, 이러한 초기 투자 비용을 상쇄할 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스마트축산 관련 경제성 분석 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바 없으며, 세계적으로도 주로 로봇착유기 도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많은 연구에서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일반 착유기보다 경제성이 낮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실시된 농가 실증 연구에 따르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착유 시스템이 로봇 착유기보다 경제적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55]. 동일한 연구 그룹의 후속 연구에서도 로봇착유기와 일반착유기 간 경제적 효율성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로봇 착유기 도입에는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고 보고되었다[56]. 미국 연구팀의 시뮬레이션 연구에서는 로봇 착유 시스템의 경우, 로봇 착유기 1기당 착유우를 50–60두 수준을 유지하지 않으면 일반 착유시스템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분석되었다[57]. 또 다른 미국 연구팀의 연구에서 사육 규모가 적은 경우엔 로봇착유시스템이 로타리팔라(parlor) 시스템에 비해 경제적이라고 보고했다[58]. 노르웨이의 연구팀은 로봇착유기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착유 두수를 34–40두 수준을 유지하며 4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결론지었다[59]. 결론적으로, 로봇 착유기 도입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비싼 상황에서 로봇 착유기의 용량에 맞는 착유우 수를 유지하고,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로봇 착유기 도입 사례를 통해 추론해보면, 스마트축산은 높은 초기 자본 투자가 필수적이지만, 그 효과가 즉각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기술의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도입 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실정에 맞는 스마트축산 기술 도입의 경제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술 도입의 경제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시중에 다양한 센서와 장비가 판매되고 있으나, 이들의 정확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축우용 센서의 정확성을 검증한 약 50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1], 비교적 예측이 정확한 반추시간의 경우에도 상관계수가 평균 0.87 정도이고, 민감도는 49%–98%, 특이도는 87%–98%로 변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추시간 외의 생리 지표 중에는 상관계수가 0.50 이하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센서 시스템의 정확도가 실제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유방염 진단은 비교적 높은 정확성을 지니는데,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ISO)에서는 유방염을 진단하는 센서 시스템의 민감도를 80% 이상 특이도를 99%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다[60]. 여기서 민감도란 실제 유방염에 걸린 소를 유방염으로 진단하는 비율을, 특이도란 유방염이 아닌 소를 유방염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하는 비율을 말한다. 유방염 발생 확률을 15%라고 할 때[61], ISO의 기준을 충족하는 센서가 알람을 울렸다면 실제 유방염일 조건부 확률은93.4%로 매우 높은 정확성을 보인다. 그러나 이런 유방염 센서조차 알람의 7% 가량은 오진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어 50두를 하루에 2회 착유하는 농가에서는 하루에 한 번 잘못된 알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민감도가 이보다 낮은 생리 지표에 대해 알람을 받는다면, 농가는 빈번한 거짓 알람에 의해 피로감을 느끼고, 센서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특이도가 낮은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의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발정 탐지에서 발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센서가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 농가는 번식 계획을 다음 주기로 연기해야 한다. 이와 같이 스마트축산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아직은 정확성 기대에 못 미치므로 해당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센서를 도입할 때는 반드시 민감도와 특이도를 검토하여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마트축산 기술의 도입이 농가의 정신 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도 있다. 스마트축산 기술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어 완성도가 부족하며, 다양한 오류가 발생한다. 특히 센서의 민감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앞서 언급한 것처럼 거짓 알람이 울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농가는 알람에 대해 지속적인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48]. 실제로 네덜란드의 농가는 로봇착유기가 유방염과 관련하여 보내는 알람 중 단지 3%에만 반응하며, 대부분의 알람을 무시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62].
스마트축산으로의 전환은 농가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해야 한다는 부담을 준다. 기존에는 단순한 노동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센서와 장비의 작동 원리, 데이터 분석 방법, 기기의 간단한 수리 방법 등을 익혀야 하며, 컴퓨터를 통해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로봇 도입으로 인해 줄어든 노동 시간보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48]. 이것은 스마트축산 기술의 도입이 절실한 노년층에게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스마트축산의 보급이 확대되는데 있어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한다.
또한, 스마트축산 기술이 동물과 사람 사이의 유대를 약화시켜 오히려 동물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48]. 센서와 로봇에 의존하게 되면 동물을 살피고 직접 접촉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동물을 생산성의 대상으로만 여길 위험이 커진다. 동물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접촉을 통한 유대감을 형성하지 않을 경우, 사람과의 만남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목장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동물과의 접촉이 줄어들면 동물의 생리에 대한 이해를 넓힐 기회가 감소하며, 동물을 단순한 생산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
게다가 스마트축산 기술은 전자기기에 크게 의존하므로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기거나 장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동물이 장시간 불편함과 고통을 겪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고장이 잦을 경우 이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기술적인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며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스마트축산의 현장 적용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양질의 빅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빅데이터는 단순히 양이 많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정보로 전환되기 위해서 특정 처리 기술과 분석 방법을 필요로 하며 매우 큰 용량(volume), 빠른 속도(velocity), 높은 다양성(variety)으로 특징지어지는 정보 자산이어야 한다[63]. 이러한 V3는 빅데이터의 핵심적인 특징을 이루며, 이후 정확성(veracity), 시각화(visualization), 가변성(variability), 가치(value) 등 여러 가지 특성들이 추가로 제시되었다[64].
빅데이터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며 이를 분석함으로써 정보 간의 관계성을 도출할 수 있는 대용량 데이터로, 용량의 크기뿐만 아니라 데이터 간의 연결성이 중요하다[65]. 가령 동물 수천만 두에 대한 혈액 분석 결과가 있다고 하자. 해당 데이터로부터 혈액 분석 항목 간의 상관성은 도출할 수 있겠으나 이 데이터만으로는 그 이상의 의미 있는 정보를 얻기 어렵다. 만약 이러한 혈액 데이터가 개체의 유전 정보, 생산성, 생리 상태, 질병, 번식, 환경 데이터 등과 연결되어 있다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가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 요컨대, 빅데이터는 서로 다른 개별 데이터들이 디지털로 “같이” 있어야 비로소 “가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다채널 디지털 데이터를 통합하는 플랫폼은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연구 과제를 통해 여러 축종에서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생리 상태, 질병, 번식 기록과 같은 정보는 사육 현장에서 제대로 기록이 되지 않거나 기록이 되더라도 수기로 작성되어 있어 데이터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센서 기술을 포함한 정밀축산 기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국 권역별 모델팜을 구축하고, 이들 모델팜에서 지속적으로 생리 상태, 질병, 번식 기록과 같은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ICT 장비의 데이터와 연계하여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축종별 데이터는 종류, 중요성, 활용도 등에서 특성이 크게 다르므로 각 축종별 전문 기관이 이들 데이터를 전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 약
축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환경 지속 가능성, 동물복지, 생산비 절감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밀사양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정밀사양이란 개체별 영양 요구량에 맞춘 영양소를 정밀하게 공급함으로써 사료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며,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사양관리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정밀사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밀축산과 스마트축산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정밀축산은 첨단 센서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체의 건강 상태와 행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이며, 스마트축산은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에 의해 분석 및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관리와 제어 작업을 자동화하여 건강 모니터링, 사양 관리, 처치 및 제어 등 일상 작업을 인간의 개입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정밀사양을 위한 기반으로서 스마트축산이 적용될 때, 동물복지와 운영 효율성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기술 도입에는 초기 비용과 센서의 정확성 및 신뢰성 문제와 같은 과제가 있다. 센서의 오차와 빈번한 거짓 알람은 작업자의 피로를 유발하고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함께 스마트축산 시스템의 정확도와 경제적 타당성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는 새로운 데이터 관리와 장비 운용 기술을 습득해야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정밀사양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양질의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대용량(volume), 빠른 속도(velocity), 다양한 형태(variety)의 ‘3V’를 갖춘 빅데이터는 유전 정보, 생리 상태, 질병, 번식, 환경, 생산성 등의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정밀축산과 스마트축산을 통한 정밀사양의 실현이 필요하다.